 장승조각, 나무에 나를 맞추는 일
장승조각, 나무에 나를 맞추는 일
죽령자승보존회 김진식 회장
죽령을 내려가는 소백산 어귀가 떠들썩하다.
한바탕 장이라도 선것처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정겹게 서 있는 장승과의 어우러짐, 죽령장승보존회의 장승축제 현장이다.
올해로 4년째 장승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죽령장승보존회의 김진식 회장을 만났다.
잊혀져가는 장승의 대중화  “하루종일 나무와 씨름을 하다보면 온몸에 송진냄새가 진동합니다. 장승은 내가 임의로 나무를 깎는다기보다는 나무의 모양에 따라 그 나무의 성질을 최대한 살려가며 조각을 한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하루종일 나무와 씨름을 하다보면 온몸에 송진냄새가 진동합니다. 장승은 내가 임의로 나무를 깎는다기보다는 나무의 모양에 따라 그 나무의 성질을 최대한 살려가며 조각을 한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지난 2일부터 영주 죽령고개에서 열린 장승축제를 주관한 장승보존회의 김진식 회장은 이렇게 장승에 대한 말문을 열었다.
같은 나무로 만드는데 하나도 같은 얼굴이 없는 장승은 그런 면에서 사람과 많이 닮아 있다. 예로부터 신성시 되어 마을 어귀에 수호신이나 이정표로서 기능을 해온 장승은 최근 종교적인 논란과 개발 논리에 의해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것 중 하나다.
죽령장승보존회는 12년 전부터 매년 4월 5일 죽령고개에 장승을 세우고 98년부터는 일반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장승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장승축제는 소백산 철쭉제 시기에 맞춰 개최돼 영주시민들의 참여가 많은 편이다. 매년 참여하는 열성팬까지 있을 정도다. 이렇게 자주 장승을 깎다보니 장승조각가가 아닌 일반인들이라 해도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시민들에게 제언을 해주는 그는 더위도 잊은 채 흐뭇한 표정을 지어보인다.
미술교사에서 조각가로
그는 영남대 미대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영주에서 3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한 일이 있다. 안정적인 교사일보다 어린시절부터 좋아하던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결심으로 나무와 인연을 맺었다.
장승을 깎으면서 생계수단으로 목수일 등 궂은 일도 마다 않는다. 주로 한옥 짓는 일을 하는데 장승이나 한옥에는 소나무가 많이 쓰이다 보니 그에게서는 늘 소나무 향이 떠나지 않는다.
그는 장승에 대한 인연을 대학시절로 꼽는다. “80년대에 대학에서는 시국장승을 많이 세웠습니다. 거기에 참여도 하고 미대 학회지에 장승에 대한 기고를 하면서가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그때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죠.”
 장승을 세우려고 전국 각지를 많이도 돌아다녔다. 돈도 필요없고 걸쭉한 막걸리만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다.
장승을 세우려고 전국 각지를 많이도 돌아다녔다. 돈도 필요없고 걸쭉한 막걸리만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다. 한번은 진주에 내려갔을 때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장승을 채 세워보지도 못하고 온 적이 있다. 배운 것도 많지만 아쉬움이 더 큰 곳이 바로 진주인데 끌이 없어 톱과 짜귀만으로 장승을 만들었다. 끌을 쓰지 않는 것이 전통방식인데 최근에는 조형미 때문에 끌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짜귀만으로 어렵사리 만든 장승은 진주의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로 지금도 공터 한곳에 쌓여져 있다고 한다.
“장승에 대한 개념은 시대적으로 변천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의 대상이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장승을 숭배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전통조각이나 전통문화로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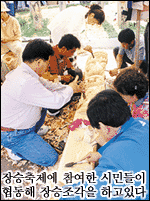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장승을 조각할 때는 ‘생삼사칠’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것은 3일, 죽은 것에는 4일간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여자를 멀리했단다. 그만큼 몸을 단정하게 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장승을 조각할 때는 ‘생삼사칠’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것은 3일, 죽은 것에는 4일간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여자를 멀리했단다. 그만큼 몸을 단정하게 했었다.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도열 초대 한국장승진흥회 회장이라는 그는 죽령장승보존회의 회장이자 한국장승진흥회의 창단 멤버다.
장승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그는 국민 모두가 장승을 전통으로 이해하고 경건히 대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가 곧 장승’이라고 말하는 김진식 회장은 우리가 우리를 깎아 세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