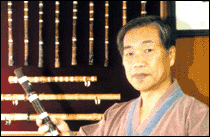 대나무가 빚는 천상의 소리
대나무가 빚는 천상의 소리
인천시무형문화재 단소장 보유자 김환중
그의 단소 이야기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올해 여든 다섯. 어린시절 서당에 갔다가 훈장님으로부터 건네 받은 단소 하나, 소년은 틈나는 대로 단소를 불었다.
어느덧 자라난 소년이 일제시대 징용에 끌려갈 때도 단소만은 가져갔다. 어엿한 가장이 된 이후에도 단소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식들조차 듣기 싫어했다는 그 단소 가락.
김환중 단소장의 오늘이 있기까지 두 부자의 단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들어보았다.
아버지의 단소가락과 함께 한 유년시절
충남 서천, 그곳에는 대나무가 자란다. 대가 자라는 마을에서 아버지의 시조와 단소가락을 들으며 자라난 단소장 김환중.
전쟁중이던 어린 시절은 누구나 배가 고픈 시절이었다. 고픈 배를 냉수 한사발로 채우고 잠이 들라 치면 여지없이 들려오는 아버지의 단소가락, 그 때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다.
아버지는 단소를 연주하면서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이따금 몇 개씩 단소를 만들어 남들에게 선물하곤 했다. 또한 장구도 치고 시조도 읊는 등 예능에 능했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자식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단소를 만들면서 그 역시 단소에 도취되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단소 제작의 길을 걷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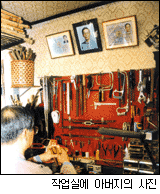 73년 장남인 김환중 단소장을 따라 아버지도 인천에 왔다. 이 때부터 아버지는 소일거리로 단소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김환중 단소장은 전파사를 운영하면서 틈틈히 일을 거들었다.
73년 장남인 김환중 단소장을 따라 아버지도 인천에 왔다. 이 때부터 아버지는 소일거리로 단소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김환중 단소장은 전파사를 운영하면서 틈틈히 일을 거들었다.단소 제작에 사용하는 공구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직접 공구도 만들었다.
손재주가 있던 그는 아버지가 만든 단소에 조각도 하곤 했다.
85년 아버지 고 김용신 씨는 단소장으로 선정되었고 아버지의 일을 돕다보니 그도 자연스레 전수자의 길을 걷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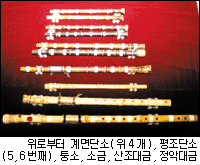 90년 아버지가 작고하기 직전이었다. 일어나 앉기도 어려워 어머니가 아버지의 등을 받치고 어머니 몸에 기대서 몸을 세운 그분은 말문을 열었다.
90년 아버지가 작고하기 직전이었다. 일어나 앉기도 어려워 어머니가 아버지의 등을 받치고 어머니 몸에 기대서 몸을 세운 그분은 말문을 열었다. “오늘 작업이 너와 하는 마지막 작업이 될 것 같구나….”
돌아가실 순간을 이미 아셨던 것인지 마지막 작업을 하시면서 “너라면 잘 해낼 것”이란 유언은 그의 생업을 바꿔놓았다.
지금도 그의 작업실 윗쪽에는 생전의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다. 항상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면 커피가 유일한 친구다. 하루 7잔 이상 커피를 마셔가며 자신과의 싸움을 할 때면 아버님이 늘 옆에서 지켜보는 게 큰 위안이 된단다.
재료따라 달라지는 단소의 품질  단소의 재료가 되는 대나무는 주로 해안지대에서 자란다. 서해에는 전라북도부터 남해를 거쳐 동해의 강릉까지 쉽게 대밭을 볼 수 있다.
단소의 재료가 되는 대나무는 주로 해안지대에서 자란다. 서해에는 전라북도부터 남해를 거쳐 동해의 강릉까지 쉽게 대밭을 볼 수 있다.
‘바위 위에서 자란 대가 재료로 좋다’는 속설처럼 대나무는 기름진 곳보다는 척박한 곳에서 자란 것이 단소의 재료로 더욱 좋다. 기름진 곳의 대나무는 물러서 재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단소는 3∼4년생 대나무를 쓰는데 내부의 구멍이 너무 커도 안되고 대나무의 마디가 너무 길어도 좋지 않다.
대나무가 수천그루 있는 넓은 대밭에 가도 단소 감으로 적합한 것은 불과 몇 십개다.
어떤 이들은 대나무 한그루로 몇 개의 단소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는 대나무 한그루에서 단 한자루의 단소만 만든다. 가장 좋은 부분은 땅위로 90㎝까지와 뿌리부분까지로 소리와 디자인이 모두 좋다.
단소를 만드는 과정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재료 구입이다. 대밭에서 단소에 쓸 대를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대밭도 묘지로 바뀌거나 관리를 하지 않아 무른 대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대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