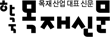목재산업 종사자들은 과거의 호황을 기억하고 있다. 항구도시 어디를 가나 웃음꽃이 피었고 생기가 돌았다. 목재제조산업이 차지하는 지역사회의 비중도 꽤나 높았다. 월급날이 되면 근처 식당들은 목재인들로 북적였다. 항구에는 원목이 넘쳐났고 제재소의 날카로운 톱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리는 시절이 있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30~40년 전의 모습이다.
1980년 이후, 아파트 건물이 주거의 메인이 되면서 목재의 사용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파트 내부에 사용되는 원목 제품의 양은 매년 줄어들었다. 아파트 내부의 가구는 MDF 표면에 화학 필름을 붙이는 제품이 주류를 이루면서 대규모화되고 단순해졌다. 합판보다 MDF 산업이 호황이었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창호로 바뀌면서 목재창호 제조산업도 사라져 갔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대중화는 목재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특성을 즐겨야 하는 목재 소비층을 둔감하게 했다. 목재의 이용은 마치 현대와 맞지 않는 전통문화 산업처럼 자존감을 잃어 갔다.
목재사용 범주가 제한돼 오면서 수십 년이 경과한 지금, 목재제조업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합판제조업의 붕괴, MDF 제조업의 쇠락, 제재, 방부, 목창호 산업도 마찬가지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아파트 건설 일변도의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줄어드는 수요를 대응하느라 전통적으로 강했던 제조산업들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렸고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버렸다.
지금은 목재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다. 목재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기회를 접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산 삼나무와 편백으로 33개 공장에서 합판을 350만㎥이나 제조하고 있다. 제재산업은 물론 다양한 목재제품 생산을 위해 자국 목재를 중심으로 제조환경을 바꾸어 나갔다. 제재설비의 무인화는 물론 합판설비도 최첨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완제품 수율을 제재목은 50%(건조와 대패 마침), 합판은 70%에 달한다. 최근 유럽에서는 제재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과 제품 수율을 더 높이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목재를 플라스틱처럼 사용해 투명한 창을 만들고 3차원 제품을 만드는 등 비약적인 기술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목재가공 설비의 발전은 과거의 경험을 넘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해준다. 작업의 안정성을 물론 작동의 수월성, 유지관리의 편이성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금의 목재제조업은 설비가 중요해졌다.
우리 목재산업이 살아나려면 시장의 수요가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법과 제도로 막힌 시장의 벽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앞으로 난연(불연)관련 기준과 층간소음에 관해 보완하면 목조건축시장을 확대할 기회가 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목조활성화 법률’이 제정되면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9년까지 자급률 27% 확대 정책을 세웠는데 이는 원자재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될 것을 의미한다. 900~1천만 ㎥의 국산재가 공급된다. 우리 목재산업이 국산재 중심의 이용변화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산림청이 공공목조건축시장 수요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고, 2029년까지 약 100개 공공목 조건축물을 짓는다고 한다. 공공 그리고 민간까지 목조건축 활성화가 진행되면 바야흐로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목재산업이 된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단절된 목재가공 기술의 발전이 집약된 가공설비의 도입이다. 국내는 안타깝게도 가공설비제조 부분도 성장하지 못했다. 탄소중립시대에 맞는 목재가공 설비도입으로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갖는 목재산업이 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낙후된 제조산업이 살아나기 위한 설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