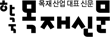지난 10일 중대본의 집계에 의하면 3월 21일 시작한 경남 등 산불로 사상자 82명(사망 31명), 이재민 3,031명, 시설피해 8,132곳, 산림소실 48천여ha, 국가유산피해 35곳이 피해를 입었다. 2000년 울진 등 산불로 2만4천여 ha의 산림이 소실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피해가 크다. 20년 전보다 전 세계 닥친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커졌고, 봄철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삽시간에 대형산불로 커졌다. 이제 대형 산불은 겨울과 봄철에는 피해 갈 수 없는 인자가 됐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2월 습도가 높은 나라인 일본의 이와테현에서 열흘 넘게 대형산불이 났다. 또한, 작년에 발생한 LA 산불은 민가를 덮치며 엄청난 수의 가옥을 태우면서 경제적 손실이 73조에 이르렀다. 국토의 63%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대형산불에 대한 대책이 더욱 절실하며, 국가재난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산불은 코로나나 홍수, 지진처럼 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영남 산불은 열흘 만에 서울시 75%에 해당하는 산림을 불태웠다. 만약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몇 배의 피해를 남겼을 것이다. 문제는 산림소실로 인한 복구는 30~50년 이상 걸린다는 데 있다. 산림과학원은 이미 영남 산불로 온실가스 366만 톤이 배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형차 3,436만 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며 배출한 양과 맞먹는다고 한다. 환경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다. 대형산불에는 산림생태 보호라는 말은 그저 구호일 뿐이다.
산불의 발생은 연간 545회나 발생한다. 봄은 점점 건조해지고 대형산불의 위험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불의 발생을 줄이는 예방도 필요하고 산불의 조기진화로 대형산불로의 확산도 막아야 한다.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진화가 필수적이다. 소방헬기만으로는 야간이나 풍속이 강한 경우 대응이 어렵다. 소방헬기는 산불의 주불을 잡기 위해 투입되는 장비다. 하지만 산불의 60%는 산불진화대원의 몫이다. 그들에게는 산불 지역에 접근이 빨라야 하고 산불을 저지하기 위한 물이 필요하다.
높은 곳까지 빠르게 필요한 물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산불진화도로’ 즉 ‘임도’가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산림보호 의식으로 임도를 내는 것조차 ‘산림 훼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부추기는 일부 환경론자들의 목소리도 연일 계속이다. 심지어 소나무가 문제라는 식의 제기와 산불에 강한 활엽수 식재가 필요하다는 식의 처방을 한다. 산불 전파가 빠르다는 소나무의 경우, 산불이 난 영남 지역에서 실제 식재한 양은 6%도 되지 않는다.
참나무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나무는 자연 발아를 통해 지금의 산림을 형성하고 있다. 활엽수의 낙엽은 두터운 낙엽층을 만들어 진화를 어렵게 한다. 위층은 소나무가, 아래층은 활엽수가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산불을 두고 수종 탓은 논쟁일 뿐이다.
산불 진화에 가장 확실한 처방은 소방헬기 증대와 임도를 늘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해 임도 개설을 위해 1,0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지자체로 예산과 권한이 넘어가자 임도 개설 실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임도 개설의 중차대성을 외면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도사업을 국가 사무로 환원하고 임도 예산을 적극 늘려서 대형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의 임도 개설을 우선해야 한다. 환경생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해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아까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