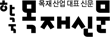경남북 산불로 심중한 피해를 입은 임목자원이 600만㎥가 넘었다. 심중하지 않아도 산불영향을 받은 임목이 많아 1,000만㎥ 이상의 임목들이 수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불피해를 받은 나무들은 껍질부에 탄화층이 주로 생기지만 목질부는 온전히 남아서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림과학원 산불피해목 연구에서도 물리·화학적 목질부 손상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다. 다만 산불피해목은 산에 그대로 방치하면 변색, 충해를 입고 재선충 발생 매개원이 되어 확산을 부채질한다는 점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산불피해목을 산에 방치한 채 1년이 경과하면 목재의 가치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수확해서 원목 상태로 약제처리해 두거나 제재 후에 건조하여 보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장기간 탄소저장과 기후변화 대응도 가능하다. 과거와 달리 단계적 이용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한 번불태운 목재자원을 아무런 노력없이 다시 불쏘시개로 넣어선 안 된다.
이번 경남북 산불피해지역은 재선충 감염지역에도 해당한다. 연구에 따르면 재선충 감염목은 산불피해를 입었더라도 재선충 자체가 사멸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엄청난 양을 처리하는 시스템과 설비보완이 필요하다. 대형산불을 전화위복 삼아 국산목재산업의 환경을 바꾸고 국산재가 국민에게 파고드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대형산불로 엄청난 양의 목재를 처리하려면 제재설비 보완, 건조설비 신설 및 증설, 마이크로파 재선충 사멸 및 건조설비 도입, 집성재 생산설비 도입, 박피설비 도입, 집재장 및 야적장 확보, 창고 확보를 해야 한다.
산불피해목의 약 20~30% 정도나 한 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원목을 약제처리해 집재장 또는 야적장에 보관하되, 문화재용 특대재는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국산재 제재소를 풀가동해 침엽수는 구조재, 집성 및 CLT용 층재, 기둥과 보용 제재목을 생산하여 건조하여 창고에 보관 비축해야 하고, 활엽수는 13mm, 30mm나 50mm 등 일정 두께 판재로 켜서 건조 후 창고에 보관 비축하되 온라인 플랫폼을 전국 판매를 해야 한다. 제재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을 최소 2.4m 이상의 장재로 수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처리할 양이 많기 때문에 말구직경 20~25cm 이상의 원목은 장재 생산을 우선해야 하고, 수확 목재자원의 경급 특성을 분석하여 가공방식에 맞는 재장으로 수확시 정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경재를 이용해 제재하고 집성하는 기계들이 개발됐다. 합판을 생산하는 기계들도 22cm도 안 되는 소경재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임업이 정상화되고 발전하려면 소경재 중심 생산라인이 필요하다. 소경, 중경목을 가공하는 최신 무인자동화제재기, 합판 생산라인, LVL과 집성재와 CLT 생산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건조시설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 재선충 사멸을 위해서 독성이나 재면 손상이 없는 마이크로파 이용 처리가 필요하다. 원목상태로 재선충을 처리하는 시간은 30~40분이면 족하다. 표면에 탄화된 부분을 제거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려면 박피기가 제재라인에 보강돼야 한다. 또 활엽수 자원을 산업화하려면 최신 집성재 생산라인이 필요하다. 활엽수야말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이지만 공급, 가공, 판매 등 어느 하나도 갖춰지지 못하고 펄프나 장작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대형 산불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산불 피해 침엽수는 구조용 목재로, 활엽수는 생활 속의 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전환할 큰 기회가 왔다. 산림청도 국산목재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를 예산확보로 보여 주길 바란다.